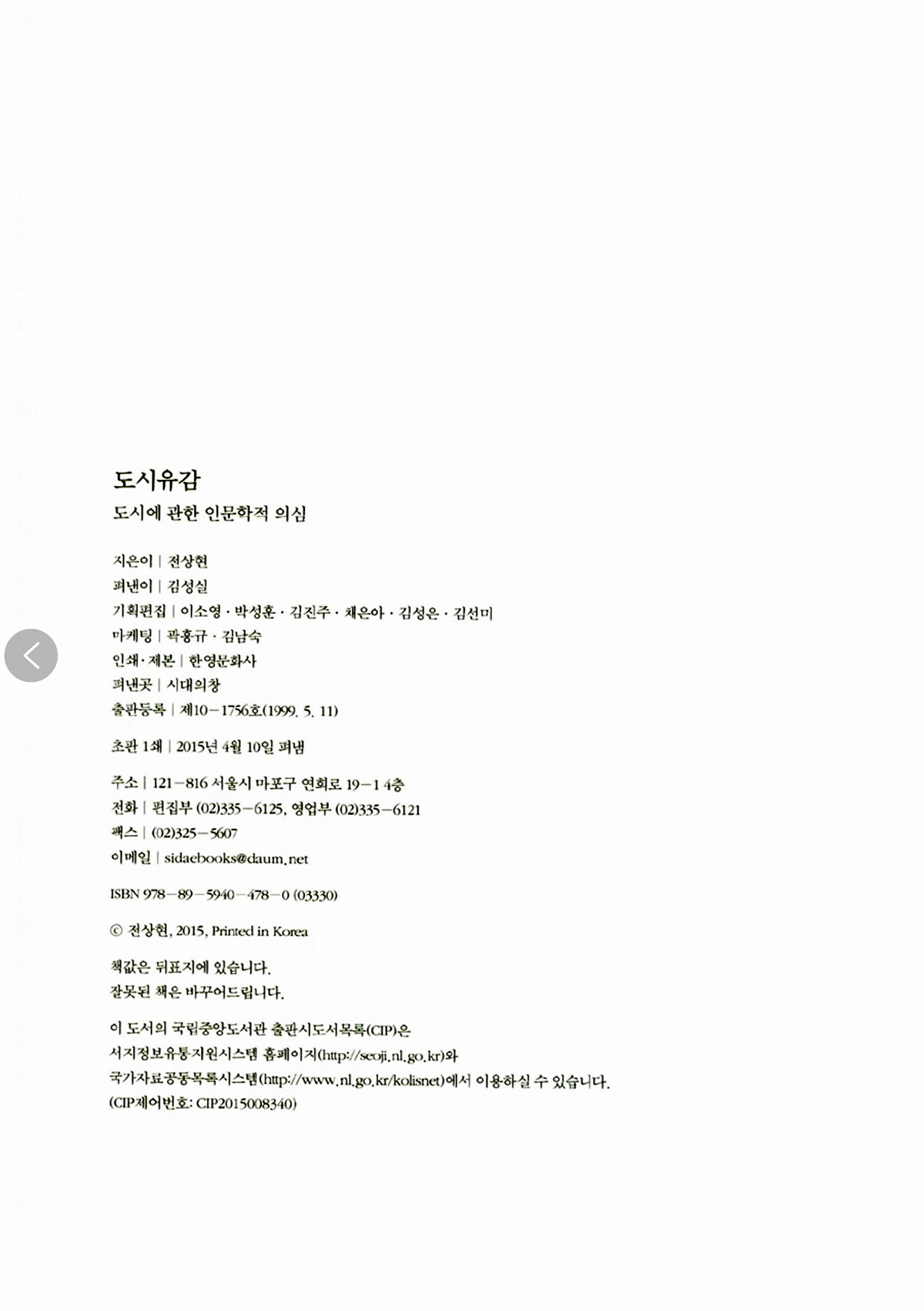TYPE
PUBLISHER/INTERVIEWER
INTERVIEWEE
Interview
건축평단
전상현
누구에게나 이상형이 있다. 보통 어릴 적에는 외모를 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된다. 나이가 들며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울은 한국전쟁 후 본격적인 산업화를 겪으며 개발 드라이브 시대를 경험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의 결과에 뿌듯해 하며 서울도 선진도시가 되었다고 자부하기 시작했다. 실제 서울은 어떠한 선진도시와 비교해도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라 평가 받는다. 또 서울에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들도 있고 좀 홀대 받기는 해도 역사유적 또한 존재한다. 좀 못생긴 구석은 있지만 그럭저럭 구색은 갖춘 셈이다. 하지만 그럴듯한 겉모습만 가지고 선진도시라 말하는 것은 얄팍한 평가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서울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를 꼽으라면 공간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공간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제는 일종의 상식이 되어버린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에 빗대어 이해해 보도록 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의 소득격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경제 민주화는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간 민주주의 역시 소득격차에 따라 소비 혹은 점유하는 공간의 질과 양의 격차에 대해 보정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공간 민주화는 경제 민주화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소득격차의 결과적 다면 중 한 면, 즉 도시공간의 계급화에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복지라는 수단을 통해 소득격차의 보정을 시도한다면 공간 민주화는 공공공간의 질과 양을 확보 함으로서 공간계급화의 보정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시민들에게 도서관과 공원, 체육시설 같은 주거 인프라를 제공하며 보행권을 최우선시하여 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가 선진도시라 부르는 도시들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통계수치로 보나 일상의 경험으로 보나 서울은 아직 공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도시라 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사람들은 공공이 제공해야 할 주거 인프라를 소득수준에 맞게 아파트 부대시설로 구매한다. 게다가 보행자는 자동차에 밀려 홀대 받기 일쑤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그럴싸해 졌는데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형국이다.
굳이 어떤 상을 염두해두고 서울을 만들어가야 한다면 외형은 이제 그만 됐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성질상 어떠한 외형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리도 없다. 대신 도시를 형성하는 철학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야 좀 더 성숙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서울이 누군가의 진정한 이상형이 되는 길이다.
- 두번째 질문 <랜드마크의 필요성에 대하여>
랜드마크라는 말이 난무한다. 언제부터인가 민간자본과 지방정부가 경쟁하듯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한다. 도시공간이라는 것이 자본과 정치의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하등 이상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들이 랜드마크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 좀 걱정스럽다. 지난 십 여년간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의 랜드마크 만들기는 대규모 개발을 바탕으로 거대하거나 특별하게 생긴 오브제 만들기로 일관해 왔다. 초고층빌딩 경쟁이 그랬고 DDP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가 그랬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에 기댄 랜드마크 만들기는 금융위기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상당수 좌초되고 말았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트리플원(111층)과 상암동의 DMC 랜드마크빌딩(133층), 세운상가 금융관광 허브빌딩(220층)건립 등이 무산되었으며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 역시 백지화되었다. 정치와 자본의 수요에 따라 랜드마크 판타지라는 거품이 형성됐다 꺼진 셈이다.
랜드마크라는 개념은 삐까뻔쩍한 메가스케일의 오브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 중에는 역사유산이나 광장 같은 공공공간 또한 많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자유의 여신상, 런던의 빅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에펠탑, 베이징의 천안문광장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리고 서울 역시 다양한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다. 시청 앞 광장, 숭례문, 명동성당, 서울역, 청계천 등 롯데월드 타워나 코엑스 말고도 서울에는 이미 다양한 랜드마크들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이 애쓰지 않더라도 서울의 랜드마크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인위적으로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어색한 이유다.
사실 랜드마크는 우리 삶의 질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살고 싶은 도시 평가항목(livable city index)에도 랜드마크는 없다. 더군다나 랜드마크의 개념이 화려한 대규모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본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결부시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본과 정치가 추구하는 랜드마크는 수요자도 수혜자도 그들일 뿐이다. 그러니 랜드마크를 오해 하지도, 랜드마크에 집착 하지도 말자. 그리고 기억하자. 삶의 질은 삐까뻔쩍한 오브제 한방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방에 기댈 만큼 서울이 후진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